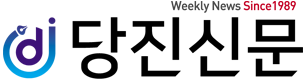[당진신문=이선우 작가] 수능시험을 보고 얼마 뒤, 나는 대학의 학과들이 주르륵 소개되어있는 두꺼운 책을 들춰보고 있었다. 부모님이 원하던 교대는 끔찍이도 싫었고, 그냥 성적 맞춰 국문과나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던 터라 크게 의미를 두고 책장을 넘긴 건 아니었다. 그런 내 눈에 박힌 여섯 글자, ‘문예창작학과’. 나는 큰 갈등이나 고민 없이 문예창작학과가 개설되어있는 대학을 찾고 원서를 냈다. 지금 그때를 떠올려서일까,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 같다. 합격통지를 받고 엄마와 나눴던 짧은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도 피식 웃음이 난다. 정확한 문장으로 기억나진 않지만, ‘긴 바바리코트를 입은 꾀죄죄한 사람들이, 술과 담배에 찌들어 좀비처럼 왔다 갔다 할 것만 같은 그 곳’에 딸을 보내야 하는 엄마의 걱정이 묻어있었다.
파릇파릇 신입생이 되어 이리저리 몰려다니던 어느 날, ‘꾀죄죄’하지 않은 두 선배와 함께 막걸리잔을 기울였다. 흐드러진 배꽃이 눈처럼 흩날리던 그 저녁, 선배들은 나에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시를 들려주었다. 시를 생각하고 시를 읽고 시를 쓰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두 사람의 맑은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금서 생각해보면 참 촌스러운 짓인데 아카시아껌종이를 모아서 분필을 말고 차곡차곡 담아 시를 가르쳐주시던 교수님께 드린 기억도 난다. 작고 깡마른 체구에 깊고 슬픈 눈빛을 가진 시인이었다. 시집을 사주겠노라 작은 책방으로 날 데려간 한 선배는 무심히 시집 한 권을 꺼내들고 아무 페이지나 펼쳐 읽어주었다. 이윤학의 배나무집 女子라는 시였다. 나는 과동아리에서 시분과를 선택했고, 2학년을 앞두고 전공을 정할 때 역시 시를 선택했다. 물론 내가 시 쓰기에 재능을 가진 학생은 결단코 아니었다. 그래서 괴롭기도 참말 괴로웠다. 시 한 줄 못 쓰고 밤을 꼬박 지새우는 날도 많았고 합평이라도 하고 나면 못 마시는 술을 들이 부었다.


풋내 나는 문청 시절을 떠올리게 된 건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열린 아트 콜로키움, <스토리가 있는 시, 행복으로 다가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 중인 신대철 시인의 특강에 참여하면서다. 강의는 랭스톤 휴즈의 작품을 읽는 것으로 시작됐다. 흑인인 시인 자신이 처한 현실 자체를 그대로 옮겨놓은 작품 <영어 B를 위한 테마>. 다른 어떤 장치 없이 시인이 경험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담은 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부엉이 / 은모래 / 한 짐 부리고 / 부헝 부헝 / 부여 무량사 / 부우헝 / 열사흘 / 부엉이 / 은모래 / 두 짐 부리고 / 부헝 부헝 / 서해 외연도 / 부우헝
<열사흘>, 박용래
열사흘이라는 제목이 오래도록 입안을 맴도는 박용래 시인의 작품. 아무리 애를 써도 은모래처럼 환한 기쁨 속에서 살 수 없는 삶의 소회를 부엉이 울음과 뱃고동 소리로 연결해 표현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나올 수 있는 시 아니겠냐는 말씀을 들으며 몇 번을 읽고 또 읽었다. 먼 기억 속에서나마 한때 나를 들끓게 했던 열망, 때로는 막연한 그리움이기도 했고 아픔이기도 했던 詩. 시를 쓰는 마음으로 살겠다던 내 오랜 다짐을 다시 꺼내어 본다.